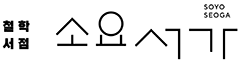박준상┃숭실대 철학과 교수
며칠 전 장-뤽 낭시의 부음을 들었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고령의 철학자의 이름을 ‘혹시나’하는 마음에 가끔 검색하고 나서 안심하곤 했었는데, 결국 결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낯설기만 하다. 한 번이라도 영혼을 만져본 적이 있었던 한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때 이른 것이 아닐 수 있는가? 사람은 막연히 자신도 타인도 죽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나와 타인의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장-뤽 낭시는 필자의 지도교수는 아니었고, 학위 논문의 보고자rapporteur(박사 논문의 심사 가능성을 판정하고 보고서를 써서 대학과 국가에 전달하는 교수)였다. 필자는 고인과 많은 편지와 메일을 주고받았고, 어느 콘퍼런스에서 스카이프로 대화한 적도 있었지만, 정작 그와 대면했던 것은 2009년 1월 파리에서 열렸던 그에 대한 콘퍼런스 ‘바깥의 형상들’에서의 짧은 만남 한 번뿐이었다. 필자는 그와 인연이 닿았던 수많은 학생 중 하나였을 뿐이고, 그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지금의 장면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와 대면의 교류를 나누었던 여러 사람(크리스토프 비덩, 장-미셸 라바테, 자크 랑시에르와 김순기 화백)은 예외 없이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필자에게 낭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는 알랭 바디우가 그에 관해 쓴 논문 「약속된 봉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던 대로 “모두가 장-뤽 낭시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의 증거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사실에 특별한 의의意義가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필자는 납득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장-뤽 낭시에게는 이런저런 이유 없이, 또한 목적도 없이, 그 자신의 표현대로 ‘무위無爲’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힘이 있었다. 또한 그 힘은 그의 얼굴⸱표정들과 몸의 직접적 현전 바깥에서도, 가령 그의 편지나 이미지 하나, 그의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접근⸱‘접촉touche’을 통해서도 뚜렷이 표출되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저작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철학자로서 그는 자신이 말하고 논증하고 주장한 것들 바깥에서, 분명히 밝혀져 드러난 것들을 가로질러서 ‘침묵의 말’을 전달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필자는 낭시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정치적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설사 정치의 영역과 우리 각자의 삶(실존)의 영역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사이’ 또는 관계의 ‘접촉’의 표식(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표식)이 되는 그 ‘침묵의 말’의 표출⸱감지와 유통이 바로 정치에서의 최종심급이라는 것이다. ‘무위’라는 척도 아닌 척도라는 것이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예 하나를 들어 생각해보자. 낭시가 자신의 삶과 글쓰기에 너무나도 깊숙이 개입했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필립 라쿠-라바르트(그는 라쿠-라바르트를 추도하는 글에서 “나는 깊은 밤 혼자 앉아 라쿠를 생각하며 울고 있다”고 썼지만, 우리로서는 그의 심정에 접근할 수 없다)와 같이 썼던 책 하나인 『나치 신화』에서 암시되었던 대로, 나치들에게서는 과도하게 규정된 분명한, 지나치게 ‘밝혀진avoué’ 언어(이데올로기)만 있었을 뿐, ‘침묵의 말’이 자리 잡을 모든 장소는 미리 파괴되었다. 그들의 언어는 결국 우리와 우리의 관계⸱사이를 절멸하는 결과로만 귀착되었다. 반면 낭시는 라쿠-라바르트와 함께 나치들과는 정반대의 위치에서, 즉 (문학적⸱시적) 침묵을 발판으로 공동체에 다가갔다. 낭시가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결국 하나일 것이다. 어떻게 ‘밝힐 수 없는inavouable’, 불확실한, 그러나 기이할 정도로 명백한, ‘벌거벗은’ 그의 ‘침묵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부서지기 쉬움과 불확실성 가운데에서의 벌거벗음. 가장 밝힐 수 없는 유대 관계에 낯선 것이 있고, 동시에 가장 평범한 만남에 낯선 것이 있다. 그러한 낯선 것, 즉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낯선 것에 노출된, 뚜렷이 내비치는 벌거벗음.” – 『마주한 공동체』
2021년 8월 29일